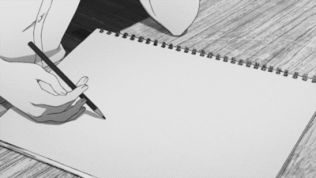책에 대해 끼적거림
빛은 잠깐 반짝이고, 그러고 나면 다시 밤이 오지.블루스타킹♪2017. 1. 17. 22:10
요즘 어떤 걸 생각하고 사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약간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겠지만 결국 '있음과 없음' 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be와 be not 이 아니라
be와 empty.
언어적인것과 비언어적인 것.
여력이 있음과 없음.
존재와 부재.
삶과 죽음.
절대 만날 수 없는 큰 두 행성이 우주의 양 끝에서 모든것을 끌어당기며 무의 상태로 바수어 가는 이미지는 오래도록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관심있게 즐기는 취미들인, 책도, 영화도, 드라마도
처음 고를때는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런 키워드를 가진 작품들만 의미있게 남는다.
숨결이 바람 될 때.
이 책을 고를때 솔직히 말하자면 뻔한 미국식 신파 내지는, 인생역전 스토리이지 않을까 의심쩍은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다른 책들보다 더 까다롭게 관찰한 후에 장바구니에 담았다.
책을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 2가지.
1. 저자가 문학을 전공한 의사이다.
2.책 리뷰를 읽어보다가 나를 사로 잡은 문장이 있었다.
말기 암진단을 받는 저자가 담당의사와 얼마나 살수 있는지 대화하는 장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쉬울 텐데요. 2년이 남았다면 글을 쓸 겁니다. 10년이 남았다면 수술을 하고 과학을 탐구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거예요."
사람이 살다보면 꼭 한번은 만나게 되는 거대한 무력감이 있다.
저자처럼 큰 병을 얻거나, 아주 소중한 존재를 잃거나, 반드시 있을거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없던 것일 때.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확실한것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의 덩어리일 뿐임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었을 때.
있음과 없음의 경계가 너무도 명확해서 중간이라는 단어조차 그 경계에서는 살아남지 못함을 알게될 때.
나와 저들이 사는 세상의 거리가 아주 멀게 느껴진다.
나는 그런것들에 차마 비극이라는 단어를 달 수가 없다. 마치 블랙홀을 유리병에 담아 놓는 것과 같다. 담을 수도 없고, 담은 후로는 블랙홀이 아닌 것이다.
책 본문에도 인용되는 고도를 기다리며에 이런 말이 있었다.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나고, 어느 날 죽을 거요. 같은 날, 같은 순간에. 여자들은 무덤에 걸터앉아 아기를 낳고, 빛은 잠깐 반짝이고, 그러고 나면 다시 밤이오지.
사뮈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포조의 대사
그렇다. 숨결이 바람이 되고.
빛은 잠깐 반짝이고, 그러고 나면 다시 밤이 온다.
단테가 연옥에 대해 썼을때 나는 그게 그렇게 인간적이고 좋을 수 없더라.
연옥만 두번쯤 더 읽었던 것 같다.
현실은 너무나 매정하게 이쪽과 저쪽을 가르므로
연옥이 있을거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아마 인간은 후라이드, 양념 양자택일보다 반반무마니에 마음이 편해지도록 설정된 존재겠지.
생과 사를 무시하고 저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연옥에서 모히또 한잔하고 싶네.
'책에 대해 끼적거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형영의 부탁으로 쓴 짧은 우정론. 김현일기 중에서 (0) | 2017.04.23 |
|---|---|
|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 (0) | 2017.03.24 |
| 2017.3-4월호 AXT에서 (0) | 2017.03.21 |
| 책 주문을 했습니다. feat.봄 (0) | 2017.02.21 |
| 불안의 서, 페르난두 페소아, 2014 (0) | 2016.07.18 |
댓글